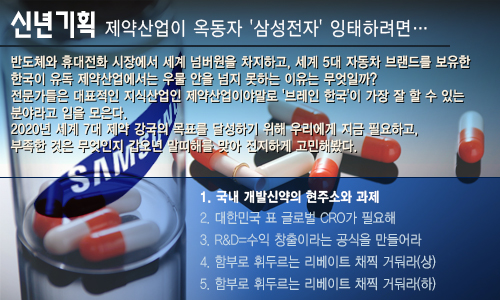신약 ‘밸류업’ 절실” 글로벌이 요구하는 제품 만들자”
“국내 제약산업…연구자도, 전문가도, CRO도 다 빈약”
|
||
종근당의 당뇨병치료제 ‘듀비에’를 포함, 2013년 연말 현재 총 20개의 토종신약이 세상에 나왔다.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들 품목중 해당 시장에서 다국적제약사 경쟁품목을 제치고 굳건히 자리매김한 약을 찾아 보긴 힘들다. 세계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는 제품은 더더욱 없다. 아쉬움이 남는다. ‘Pharma 2020’,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을 비롯 보건복지부, 미래과학부 등 각 부처별 지원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정부도 업계도 그 어느때보다 신약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00번째 국산신약이 나왔습니다”라는 보도가 쏟아지는 것도 좋지만 얼마만큼 효능·안전성·편의성 면에서 기존에 출시된 약에 비해 우월한 약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정부도 지원하고 업계도 R&D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블록버스터 탄생에 우리는 얼마나 다가서고 있을까? 국내 제약업계의 신약개발 프로세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Money Game’ 어려워 방법은 찾았다. 그런데…
현재 국내 제약기업이 미국 FDA에서 시판승인을 받은 품목은 팩티브와 성장호르몬 2개에 불과하다. 통상 임상시험에 있어 미 FDA, 유럽 EMA 수준에 부합하는 신약을 허가받기까지 약 2조원의 R&D 비용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것이다. 국내 1위 기업이었던 동아홀딩스 연매출이 1조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볼때 ‘자본’이라는 하나의 요소만 놓고 봐도 아직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신약 독자개발은 무리임을 알 수 있다. 토종 제약사들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다.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상위 제약사들은 ‘후보물질을 2상까지 진행하고 좋은 데이터를 구축해 빅파마에 아웃소싱한다’라는 목적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손지웅 한미약품 부사장은 “신약개발은 전세계 모든 정보를 동원해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영역”이라며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경험이 없는 곳이 우리나라다. 다국적사와 제휴를 통해 그 확률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후보물질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다. 단순 새로운 물질의 발견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없다. 독창적이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많은 다국적사들도 R&D의 페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어떤 기전을 가진 약이 나오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얼만큼 이득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고 있다. 내부적으로 개발에 대한 ‘이정표’가 있다. 최초의 연구를 시작하고 임상 진행중, 그 단계마다 이정표를 적용해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단계가 올라 갈수록 논의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을 쏟아 붓는다. 개발이 가능한 다양한 후보 물질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투자위원회’도 따로 두고 있는 회사도 적잖다. 위원들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담당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과학기반의 판단 뿐 아니라 수익성도 논의된다. 남수연 유한양행 소장은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의 니즈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새롭다’ 싶으면 마구잡이 식으로 달려 든다”며 “일단 개발부터 하고 보자는 논리로는 아무리 신약을 만들어 내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분별력있는 전문가와 리더의 부재, 그리고 CRO
‘투자위원회’는 토종기업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서다. 그러나 별도 부서 구성의 여력이 있더라도 구성원이 문제다. 국내 제약업계는 기초과학에 있어 전문 인력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의약사 출신에, 글로벌 법인 근무경험이 있는 이들도 마케팅 쪽에 쏠려있는 경우가 많다. 다국적사 한국법인에서 근무하는 의약사들의 경우 현상이 더 심하다. 국내 시장에서 회사의 국적을 떠나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연구인력의 수출이 보다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얼마전 내한한 A 다국적 본사 연구수석은 “한국은 제대로된 연구인력의 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인력을 선진국으로 내보내고 또 선진국의 인력을 국내로 끌어 들여야 한다”며 “신약개발은 누가 빠른지 겨루는 경마보다 양떼몰이에 가깝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처방을 많이 하는 의사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키닥터’ 역시 부족하다. 국내 의료진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인지도와 명성 면에서 미국, 유럽 등 전문의들과 차이가 있다. 국내 의사중 이같은 지위를 고수하고 있는 의사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전문가인 서울성모병원의 김동욱 교수 정도다. 그는 아시아 최초로 백혈병 진료 지침을 만드는 유럽백혈병네트워크의 패널위원으로 선정됐으며 노바티스, 화이자 등 회사 본사의 공식 자문위원이다.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본사에 진행하는 글로벌 임상에 국내 의료진을 주력 연구자로 추천해도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이 임상센터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연구자 개인에 대한 니즈는 부족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차원에서 영향력있는 CRO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다국적제약사들은 임상의 대부분을 CRO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의 아웃소싱 규모는 2011년 기준 10~50억이 가장 많고 10억 미만이 35%인 등 아웃소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추진역량과 체계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국내 CRO 상위 2개사가 연매출 80∼150억원, 중견 2개사가 40∼60억원이며 대다수는 20억 미만에 그치고 있다. 글로벌 1위사와 비교해 매출액은 1/230, 인력은 1/93 수준에 불과하다. 경험이 없으니 글로벌 CRO와 견줄 경쟁력을 기르기도 힘든 상황이다. 김동욱 교수는 “경쟁력있는 CRO가 있으면 실력있는 의사, 국내사가 어우러져 다국가 임상(혹은 임상내 아시아 파트)을 주도하는 경험을 쌓기 용이하다”며 “아시아에서는 이미 중국, 일본 등의 CRO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 CRO가 늘어나고 국내 제약사가 CRO 활용에 대한 니즈를 인식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연구자와 제약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