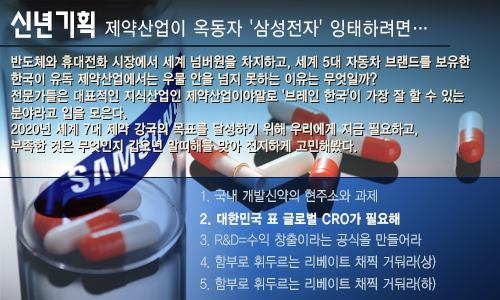디자인부터 의료진과…’한국형 신약’ 필요
신약개발 전단계 서포트하는 CRO설치…정부지원 절실
|
||
과거 신약개발은 의료진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대개 의료진의 참여는 후보물질 발굴과 동물실험이 끝나고 임상시험 단계부터 이뤄져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초기 개발단계부터 의료진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들은 신약개발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 물질발굴 단계부터 의료진과의 협력을 선호한다. 또한 거의 논문수준에서 그치는 의료진들의 아이디어를 제약사가 재빠르게 캐치하면 더 좋은 약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국내 제약사들도 초기 개발단계부터 의료진과 협력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의사 출신 개발 임원을 초빙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와 비교하면 인프라에서 절대 열세에 있다. 의료현장과 중개연구를 연결해주는 외부기관도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상품화까지 제약사와 의료현장을 이어주는 ‘대한민국 표 글로벌 CRO’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사 머릿속에서 나온 ‘헌터라제’…제약-의료진 협력하면 신약개발 수월
의료현장의 아이디어가 제품화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 약물로 녹십자의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가 있다. 세계 두번째로 개발된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는 삼성서울병원 진동규 소아과 교수의 머리에서 나왔다. 그는 15세 전후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헌터증후군 환자를 진료하면서 의약품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진 교수는 2002년 산자부 과제를 통해 2007년까지 항체 개발과 동물모델의 개발 및 효력확인, 실험실 규모에서 생산공정을 혼자 힘으로 확립했다. 헌터증후군이 유전되는 마우스를 만드는 데만 만 4년이 걸렸다. 개발 당시엔 비교할 수 있는 헌터증후군 치료제도 없었다. 첫 헌터증후군 치료제 ‘엘라프라제’는 2006년에나 허가를 받았다. 2008년 녹십자를 만나면서 상업화의 속도가 붙었다. 녹십자는 기술이전을 받아 생산공정을 개발하고, 비임상부터 임상시험을 진행, 4년만에 시판승인을 얻어냈다. 헌터라제는 의료진이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제약사가 상업화에 나선 케이스인데, 처음부터 의료진과 제약사가 손을 잡았다면 개발기간이 크게 단축됐을 것이다. 녹십자 박두홍 종합연구소장은 “최근 신약개발은 의료현장의 아이디어에 의해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의료진과 협력을 통해 진행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신약개발 초기단계부터 의료진과 협력하면 현장 아이디어와 경험을 얻을 수 있다”며 “특히 환자의 샘플조직을 활용해 구체적으로 타깃의 효력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국내 제약사들도 의료진과의 중개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신약개발 초기 단계부터 의료진들이 참여하면 후보물질에 효능을 보이는 환자군을 보다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임상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다국적 제약사들은 중개연구에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국내 상위 제약업체 관계자는 “임상 단계 이전에 필요할 때가 있으면 의료진들과 협력을 타진하지만 조직이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제약과 의료현장 연결창구 필요…정부 중개연구 지원체계 절실
대형병원에서 이뤄지는 연구자 임상의 관리나 지원도 그때그때 뿐이다. 제약사를 연결하는 창구가 없다보니 병원은 병원대로, 제약사는 제약사대로 따로 따로 연구만 진행될 뿐이다. 2010년 삼성서울병원을 시작으로 최근 서울아산병원까지 연구자임상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원내 CRO(A-CRO)가 설치되면서 작게나마 중개연구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듀크 TRI 등 대학병원 내 임상-중개연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돼 운영되고 있다. A-CRO는 연구자임상 단계를 지원하는데, 상업화 임상을 지원하는 일반 CRO 역할까지 합쳐진다면 신약개발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A-CRO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료현장의 임상-중개연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잡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도출부터 제품화까지 서포트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인 한국형 ‘T-CRO’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이디어 도출부터 비임상, 임상, 제품 허가까지 신약개발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한국형 CRO를 민관 주도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진과 제약회사의 중개연구를 도모하기 위해 미국이 1998년 설립한 CIMT(Center for Integration of Medicine and Innovative Technology)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CIMT는 보스턴 지역의 의료·공학 연구관련 12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60개 이상의 기업이 파트너로 나서고 있다.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기관은 설립 이후 총 55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200개가 넘는 특허를 취득했다. 한해 예산만 1500만 달러에 달한다. 늦었지만 우리 정부도 의료현장과 제약회사를 연결하는 중개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서울대병원 등 10곳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기초연구 및 중개연구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과 제약회사의 공동연구 과제에 정부의 자금지원이 활성화되면 논문수준에 그친 많은 연구결과들이 제품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